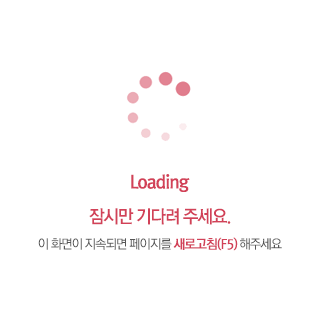제목21세기 문명의 증거는 ‘응답 있는 사회’ _ 박호재 문화사업실장
작성일2014-09-02
작성자 관 * 자
조회 912
21세기 문명의 증거는 ‘응답 있는 사회’
박호재 _ 문화사업실장
생명은 축복이고 환희라지만, 세파에 허둥대는 범인의 삶은 늘 힘겹고 답답한 일이 지천이다. 돌이켜보면 그 고통의 8할은 대부분 ‘응답 없음’ 때문이다.
그리운 이에게서 오지 않는 소식, 갖은 노력과 수고에도 되돌아오지 않는 응당한 결실, 애타는 호소와 억울한 하소연에도 대답 없는 세상인심, 간절한 진심을 무심히 외면하는 관계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피땀 흘린 농부의 꿈을 배반한 부실한 추수, 부지런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저임금…세상은 늘 이렇듯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인 수신 없는 발신자들의 고통으로 가득하다.
살아남은 자들의 외로움은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가 즐겨 사용하는 대주제이기도 하다. 나 뿐만이 아닌 또 다른 생존 인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발신을 보내고 드디어 누구인가의 응답이 지지직거리는 수신기를 통해 접속됐을 때, 관객들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친다. 접속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운 이에게서 오지 않는 소식, 갖은 노력과 수고에도 되돌아오지 않는 응당한 결실, 애타는 호소와 억울한 하소연에도 대답 없는 세상인심, 간절한 진심을 무심히 외면하는 관계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피땀 흘린 농부의 꿈을 배반한 부실한 추수, 부지런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저임금…세상은 늘 이렇듯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인 수신 없는 발신자들의 고통으로 가득하다.
살아남은 자들의 외로움은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가 즐겨 사용하는 대주제이기도 하다. 나 뿐만이 아닌 또 다른 생존 인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발신을 보내고 드디어 누구인가의 응답이 지지직거리는 수신기를 통해 접속됐을 때, 관객들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친다. 접속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세대 소통의 전형적 매체로 자리 잡은 SNS 공간 역시 공감의 응답을 기다리는 외로운 발신자들의 터미널에 다를 바 없다. 낯선 타인들을 향해 글을 띄우고 댓글을 달며, 얼굴 없는 소통을 이어간다. 관심을 갖거나 관심을 욕망하는 인간 실존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빈틈없는 인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현인 공자조차 세상의 무관심에 괴로워했음이 종종 문헌을 통해 드러난다. 병환중인 말년에 자신을 돌보던 제자 자공이 평소와는 다르게 처소에 느린 걸음을 하자 ‘왜 늦게 왔느냐’ 고 다그치며 이렇게 격한 노래로 서운함을 토로했다. 태산이 무너지는가! 들보와 기둥이 무너지는가! 철인이 시드는가! 작가 이한우는 주위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곤 했던 공자의 이러한 인간적 면모를 추려내 ‘슬픈 공자’라는 명저를 엮어내기도 했다. 만인이 세상사는 지혜를 구하는 공자 또한 이러했으니 범인의 삶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단식 농성으로 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세월호 사태 또한 다를 바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진상을 밝혀 책임을 가려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국가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관심이 국민적 망각으로까지 이어질까 두려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파문은 수신을 접하지 못한 발신자들의 고통이 극한으로까지 치달릴 수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술을 통해 전체주의와 역사주의를 열린사회의 적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들어 개인의 자유 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열린사회 또한 무관심과 외면이 만연된 사회구조 속에서는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랑의 적은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다’라는 엘리 위젤의 직관이 우리의 시대에 더욱 통렬하게 다가서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철저하게 고립된 아우슈비츠수용소 생활을 직접 겪은 엘리 위젤은 그 참혹한 체험을 통해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망가뜨리는지를 철학의 명제로 전 인류를 향해 토로한 셈이다.
21세기 문명사회의 증거는 이제 공동체 내부의 발신과 수신의 원활함, 이를테면 ‘응답이 있는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지도 모른다. 우선 우리들 자신부터 고통 받고 있는 주변의 누구인가로부터 애타게 호출되는 발신은 없는지 삶의 관계들을 부단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댓글입력(500Byte 제한)
(0/500)